42일 전
오래 만들어 같이 쓰는
세월을 머금는
전주장
시간을 들일수록 진가를 드러내는 것들이 있다.
술 향은 진해지고 장 맛은 깊어지며 인연은 무르익는다.
전주에서 만든 장(欌)인 전주장도 그러하다.
시간에 숙성됨에 따라 은은한 빛깔과 단단한 강도를 지니게 된다니, 수십 년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지 않다.
바래지 않는 가치
사소한 공정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공들인 물건은 손쉽게 만든 것보다 견고하고 아름답다. 오래 쓰일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더욱이 나무로 만든 목가구는 이러한 생의 원리를 오롯이 품고 있다. 우리나라 전통 가구인 장(欌)은 목재로 만든 일체형이다.
전주는 예부터 가구공예가 발달한 지역이었다. 목재가 풍부하고 기술이 뛰어난 장인이 많았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 양반가에서 주로 쓰이던 전주장은 여닫이문과 반닫이를 결합해 의복은 물론 각종 문서까지 다양한 귀중품을 수납할 수 있었다. 방이 좁은 한옥 생활에 맞게 설계해 실용적이다.
국가무형유산 소병진 소목장은 “전주장을 통해 목가구가 발전하기 적합했던 전주의 문화적 환경을 알 수 있으며, 당시 시대상과 선조들이 추구한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역 장과 달리 굴곡이 없어서 관리가 쉽고 질 좋은 목재를 써서 튼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선조들의 지혜와 미감을 담은 가구는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150여 년 동안 맥이 끊겼으나, 시간에 바래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 소병진 소목장이 오늘날 복원하고 있다.
기다림의 미학
전주장은 시간으로 숙성하고 시간으로 완성하는 물건이다. 짧게는 백 년에서 길게는 천년을 산 고사목을 원재료로 하고, 손질부터 완성까지 수십 년이 족히 걸리기 때문이다.
제작은 좋은 목재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한다. 중요한 과정은 건조이다. 제재(베어낸 나무로 재목을 만듦) 후 수평으로 쌓아 3년 동안 햇볕과 바람에 바짝 말린 후, 뒤집어서 말리길 반복하며 15년에서 40년을 보낸다. 이 과정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 수분 함량이 줄어 뒤틀림 없이 곧고 단단한 목재로 거듭난다.
건조가 끝난 나무를 짜맞추는 동안 다시 2년이 훌쩍 간다. 못을 박지 않고 홈을 파서 끼워 넣는 결구법으로 견고한 장을 만드는 것이다. 기나긴 시간 끝에 완성한 장은 겉보기에 빼어나며 내구성이 뛰어나다.
나무마다 새겨진 고유한 무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멋스럽게 나이 들어간다. 어렵게 되살린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 소병진 소목장은 “전통 목가구의 원형인 만큼 후대에 남겨야 할 국가적 자산이다. 지역민의 관심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개인적·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전주장이 무형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으며 오래도록 빛을 발하길.
- #전북특별자치도
- #2025전북
- #얼쑤전북
- #2월호
- #전주장
- #목재전통가구
- #전통가구
- #국가무형문화유산
- #전통목가구
- #전주전통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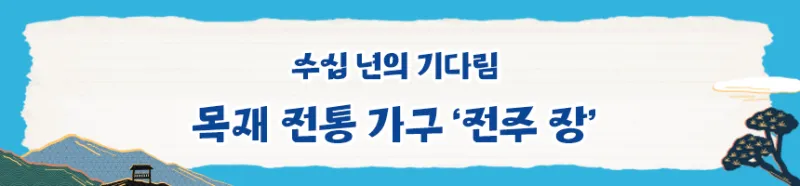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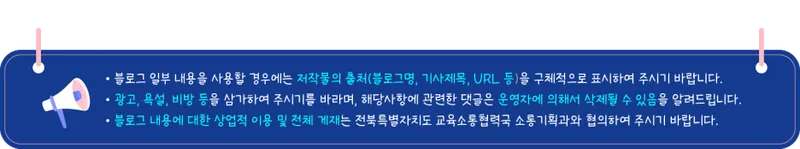





![[나의 경기도 2월호]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보세요! <경기도 원데이 클래스 이벤트>](https://cdn.welfarehello.com/naver-blog/production/gyeonggi_gov/2025-02/223749996115/gyeonggi_gov_223749996115_0.jpg?h=160&q=100&w=160)



![[2025] 안성시 소식지 2월호가 도착했습니다💌](https://cdn.welfarehello.com/naver-blog/production/anseongsi1/2025-02/223746410824/anseongsi1_223746410824_0.png?h=160&q=100&w=160)